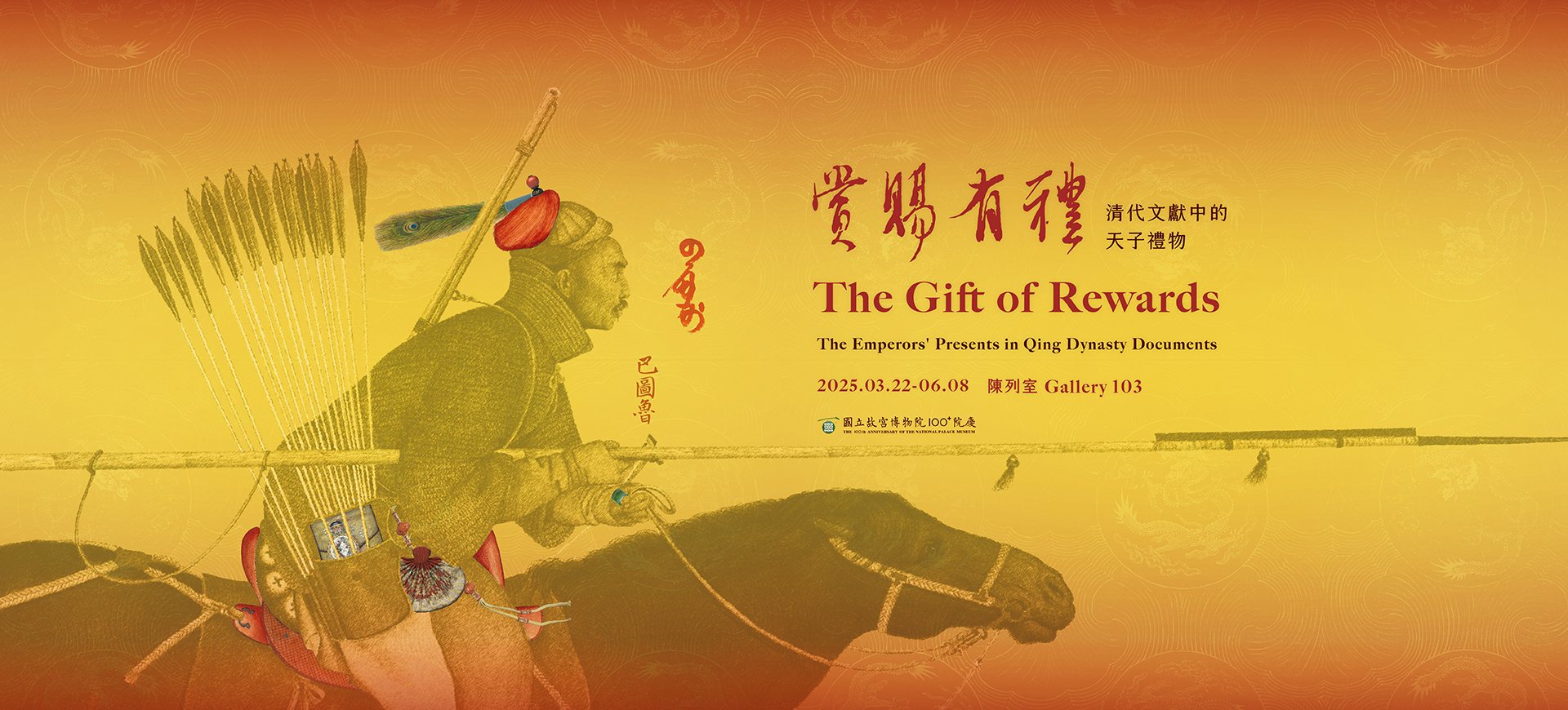귀한 선물이 내려오다
고궁박물원이 소장하고 있는 감사의 상소문 기록에 따르면 하사된 물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하사한 글씨와 친필 시문, 서적, 종이, 벼루, 주머니, 접는 부채, 비단, 모자와 예복, 소, 양, 말과 같은 가축, 궁중 요리, 알약, 보약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옥 반지, 도자기병, 코담배병, 마노로 만든 상자, 심지어 은과 은괴와 같은 화폐까지 존재하여 종류가 매우 풍부했습니다.
선물의 종류와 속성은 크게 차이가 나며, 이것이 황제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사된 선물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주로 일상적인 기물로서 실용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싯돌 주머니: 황제의 은총 아래 전해진 만주족 전통
상주문에는 “부싯돌은 새로 만든 형태이며 주머니는 주상께서 몸에 지니시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싯돌 주머니는 청대 남성이 허리띠에 차고 다니던 물건으로 부시, 부싯돌 그리고 불쏘시개를 넣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부시는 강철이나 철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불쏘시개는 불이 잘 붙는 잘게 찢긴 섬유질 재료입니다. 이 둘을 부싯돌과 함께 마찰시키면 불꽃이 생기고, 그 불꽃으로 불쏘시개를 태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싯돌 주머니 또는 부싯돌 상자는 과거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던 만주족 남성들이 외출 시 반드시 지니던 필수품이었습니다.
청대의 황실과 귀족들에게 있어 부싯돌 주머니를 몸에 지니는 일은 단순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 조상을 기리고 만주족 전통 문화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전시된 유물이 노진성이 당시 하사받은 바로 그 부싯돌 주머니는 아니겠지만 청대의 관리가 이 물건을 하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황제가 그 인물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극식(克食): 황제의 수라상에 오른 진미
-
하미 멜론을 하사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상주문
하남(河南)·하북(河北)의 총병관(總兵官) 기성빈(紀成斌)
청 옹정 3년9월26일(1725-10-31)
故宮011582청대 관리들이 황제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며 올린 감사 상주문에는 음식과 관련된 특별한 하사품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는 만주어로 ‘커스(Kesi)’라 불리며, 본래 ‘은혜’ 또는 ‘하사’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만주족의 공동 식사 문화에서 유래한 전통적 표현으로, 한자로는 흔히 ‘克食(극식)’이라 표기되었습니다. 1717년 조홍섭(趙弘爕, 1656–1722)이 올린 상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또한 극식을 두 차례 하사하시어 모두 황제의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특별히 성지를 내리시어 신에게만 천상의 맛을 하사하시니, 이는 평생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극식은 대체로 황제의 수라상에서 엄선된 진귀한 음식으로 특별한 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극식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1726년 모문전(毛文銓)이 올린 상주문에서는 옹정제가 친히 쓴 ‘복(福)’자와 함께 ‘풍양(風羊) 극식’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풍양은 만주인이 초원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던 육류 보존 방식으로 양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깨끗이 제거한 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 말려 만든 건조 양고기입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고기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도 즐겨 먹는 하미 멜론 또한 당시에 황제가 하사한 극식의 일종이었습니다. 1725년, 기성빈(紀成斌)은 옹정제로부터 신쟝(新疆)과 간쑤(甘肅) 일대의 하미(哈密) 지역에서 들여온 멜론을 하사 받고 곧바로 감사의 상주문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하밀과(哈密瓜)’를 잘못 적어 ‘하밀과(哈蜜瓜)’라고 쓰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담배병: 궁중 공방에서 탄생한 황실의 소품
전시장에는 강희 연간 궁중 공방에서 제작된 구리 바탕에 법랑으로 그려진 코담배 병 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구 가장자리에는 분홍색 모란꽃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병 몸체의 양면에는 각각 한 쌍의 나비, 양 측면에는 노란색 여섯 잎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색감과 정교한 문양은 궁중 공예의 뛰어난 미감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이 코담배 병이 강희제가 좌세영에게 하사한 그 물건과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가 받은 코담배 병 또한 이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을 것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위 법랑으로 그린다는 것은 기물의 표면에 법랑 채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공예 기법은 유럽에서 전래되어 강희 연간에 중국에 전해졌으며 그 화려하고 정교한 양식은 강희제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희제는 특히 이 기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궁중 내에 전용 공방을 설치하고 중국식 법랑으로 그려진 용기의 제작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게 하였습니다. 1718년은 강희제가 법랑 공예에 가장 깊은 애정을 보이고 큰 자신감을 가졌던 시기로 평가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궁중에서 제작된 법랑으로 그려진 용기를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선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옥 ‘희(喜)’ 자 활쏘기용 반지: 가경제의 포상과 격려
백련교는 남송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해 온 민간 비밀 종교 조직으로 역대 왕조마다 민중을 규합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대 건륭제 말기에 이르러 백련교의 활동은 더욱 빈번해졌고 이는 조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성덕 등을 비롯한 관리들이 백련교 교도 68명을 검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던 조정의 위신을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경황제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며 풍성한 포상을 내린 것입니다.
이 백옥으로 제작된 반지에는 ‘희(喜)’ 자가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의 소장품 가운데에는, 이와 유사하게 ‘수(壽)’ 자가 새겨진 반지나,
건륭제가 지은 시문이 새겨진 반지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반지는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감상과 수장(收藏)을 위한 성격이 강하며 황제가 공을 세운 대신들에게 하사하는 예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