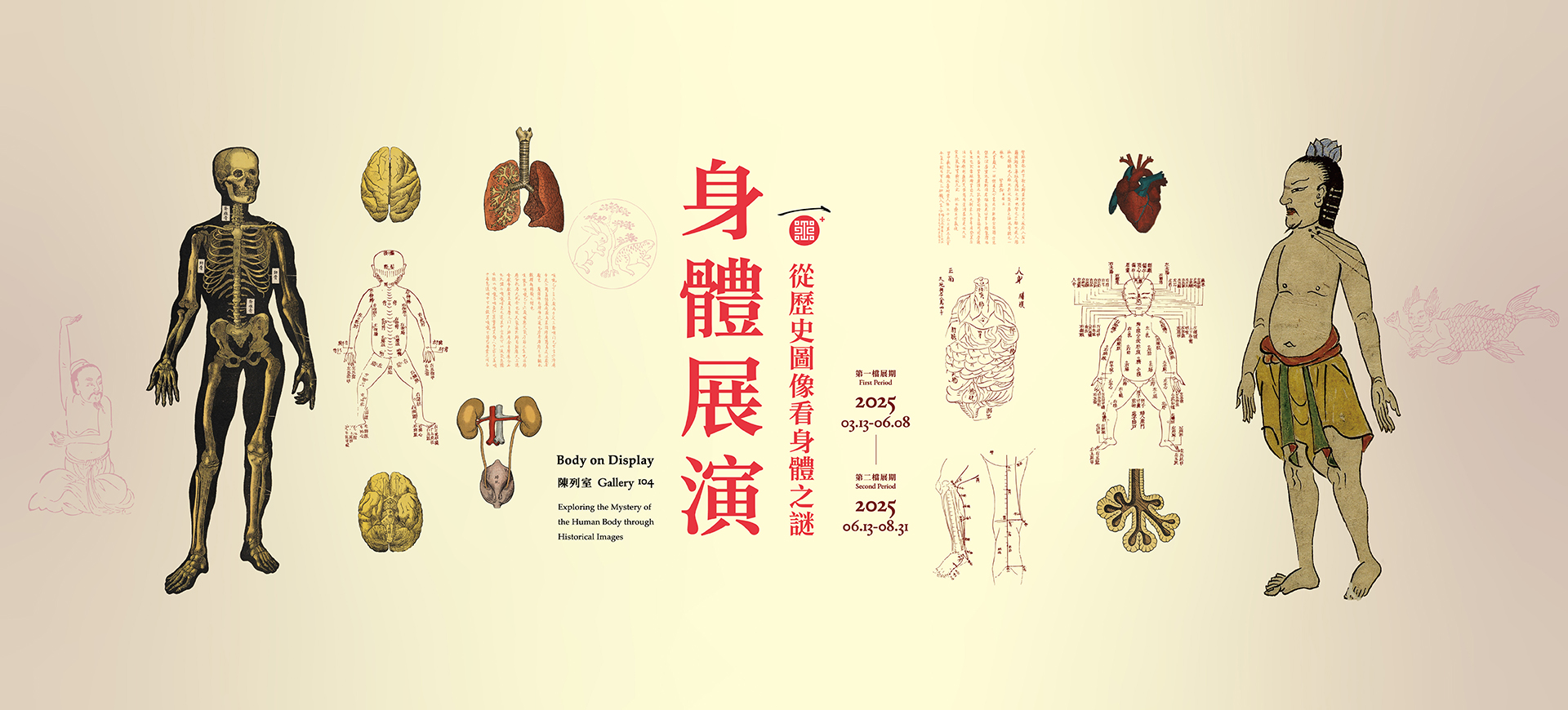신체의 규율
정치 권력의 신체 통제
정치 권력은 특정한 신체 동작과 의식을 통해 신체를 길들이고 질서에 복종하게 하며, 이를 권력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곤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점술 서적 『어제신집단역정수(御製新集斷易精粹, 황제의 명으로 새롭게 편찬한 주역의 정수 모음집)』의 점괘 시와 채색 삽화, 그리고 〈이리(伊犁)의 회부(回部) 지역 평정을 기념하는 그림〉 시리즈 중 〈승리를 축하하는 장병들의 연회도〉가 차례로 전시됩니다. 그림 속 관리들은 황제를 대할 때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과 신분제의 규율 속에서 길들여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바티칸 교황청 도서관(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에 소장된 일본 판화 〈문장의 시조(文章之祖,Bunsho No Soshi)〉의 출력 이미지를 함께 선보입니다. 이 그림은 대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계급이 높은 인물은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상징하는 반면, 계급이 낮은 인물은 낮은 곳에 꿇어앉아 신체적 자세를 통해 복종과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벌과 형구를 통한 신체의 처벌
통치자나 사법 기관은 형벌과 형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와 권력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밧줄과 칼사슬은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육형(肉刑)은 사지를 손상시키거나 피부에 낙인을 남기기도 합니다. 일부 형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민속 활동의 일환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嘉義) 성황묘의 기복(祈福) 의식과 둥강(東港) 영왕평안제(迎王平安祭典)에서는 종종 칼사슬을 착용한 사람들이 등장하며, 이는 액운을 물리치고 순조로움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현대 종교 행사에서는 종이로 만든 형구를 사용하며, 의식이 끝날 무렵 이를 소각함으로써 죄업이 사라지고 업장이 해소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교 질서를 통한 신체의 규율
-
『신편찬도증류군서류요사림광기(新編纂圖增類群書類要事林廣記, 새롭게 편찬된 삽화와 항목이 추가된 여러 책
(원 지순(至順) 연간 건안(建安) 춘장서원(椿莊書院) 간행본)
〈습의수도(習义手圖)〉, 〈습지읍도(習祗揖圖)〉
(송) 진원정(陳元靚) 찬
고선(故善)004363-004374중국 전통의 예법(禮法)은 다양하며, 대상에 따라 동작도 달라집니다. 예법은 신체 동작과 자세를 규율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를 통해 예제(禮制)의 질서와 신분 관계를 드러냅니다. 『신편찬도증류군서류요사림광기(新編纂圖增類群書類要事林廣記, 새롭게 편찬된 삽화와 항목이 추가된 여러 책들의 요점을 요약한 사전)』에서는 다양한 인사 예절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동작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수(义手, 또는 ‘차(叉)’)는 아랫사람이 웃어른에게 하는 예법이며, 지읍(祗揖)은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절하는 동작, 전배(展拜)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예법입니다. 이러한 예법은 오랜 신체 훈련을 통해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결국 개인이 일상 속에서 예교의 규범을 내면화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신체는 예제 질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