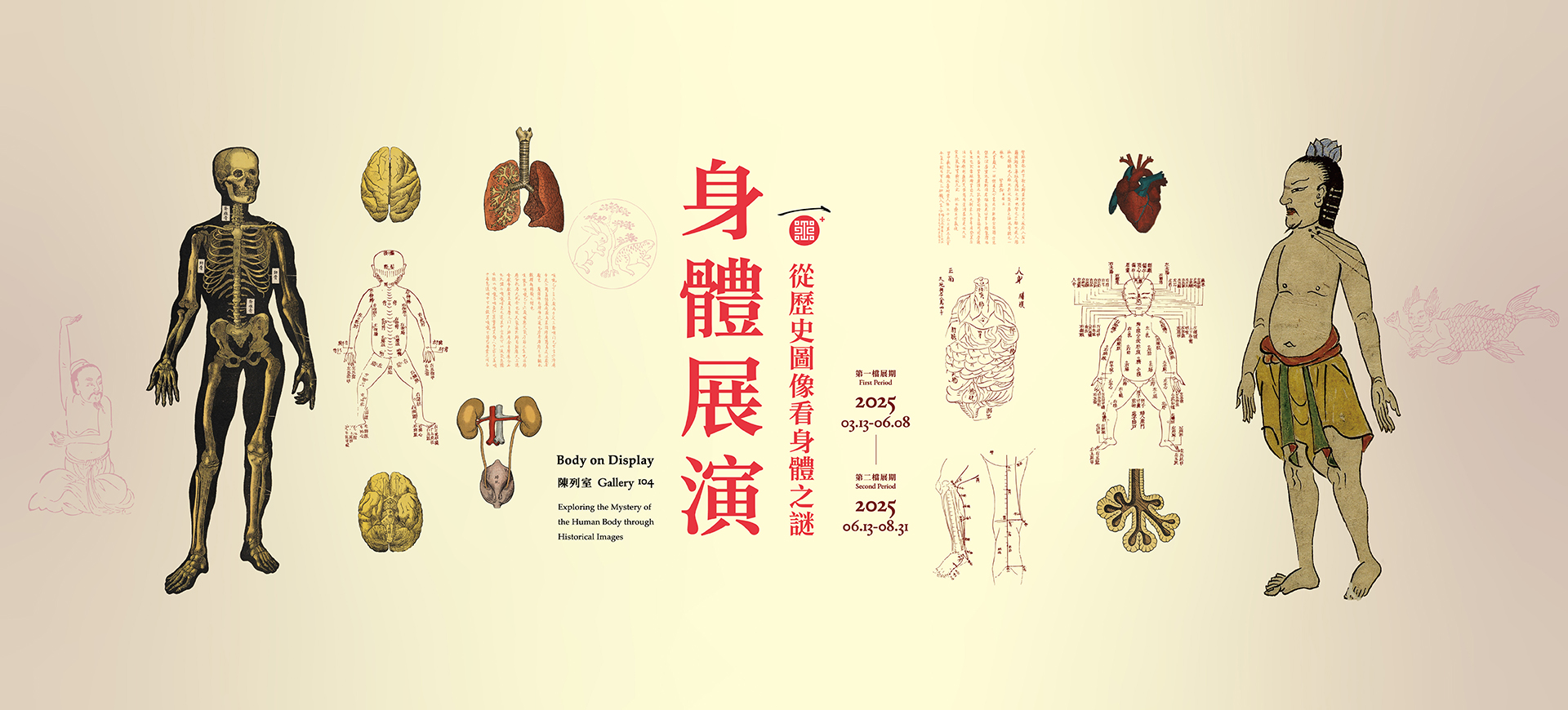신체의 훈련
신체 훈련은 단순히 건강과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지혜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군사 훈련, 신체를 단련하여 장수하기, 자손 번식, 생리적 욕구 충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신체를 훈련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특정 동작이나 심지어 가치관까지 몸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신체를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청대 낭세녕(郎世寧)이 그린 아옥석(阿玉錫)이 창을 들고 적을 물리치는 그림〉, 『소림곤법천종(少林棍法闡宗)』, 『삼재도회(三才圖會)』, 『적봉수(赤鳳髓)』, 『신전위생진결(新鐫衛生真訣)』 등의 옛 책과 회화, 그리고 코담배 상자 뚜껑에 숨겨진 비밀 연희도를 통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신체가 어떻게 체계화되고 상징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예와 심신 수양을 증진하는 역할을 했음을 조명합니다. 또한, 관람객은 소림곤법(少林棍法), 오금희(五禽戲)*, 팔단금(八段錦)** 등 동양의 신체 수련의 정교함을 목격하고, 서양의 비밀 연희도에 담긴 예술과 신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가(道家)에서 다섯 짐승의 자세를 흉내 내어 신체의 여러 관절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 순환이 잘되게 하는 양생법(養生法).
**중국 고유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법
무(武)를 숭상함
옛 사람들은 국가를 보호하고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무예를 연마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작과 가치관을 신체적 습관으로 내면화하며 독특한 신체 특성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병록(兵錄)』에 수록된 다양한 권법, 명대 군사 전략가 척계광(戚繼光, 1528–1588)의 『기효신서(紀效新書, 효율적인 군사 전략과 성과를 쓴 새 책)』에 기록된 무기 사용법 그리고 『소림곤법천종(少林棍法闡宗, 소림 곤봉술의 종지를 해설한 책)』에 소개된 소림 무술의 근본 전통인 곤봉술 등을 선보입니다. 또한, 회화는 신체를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 낭세녕(郎世寧, Giuseppe Castiglione, 1688–1766)이 그린 〈아위시(阿玉錫)가 창을 들고 적을 무찌르는 그림〉를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칼무크족 장군 아위시(Kalmouk Ayusi)가 준가르 칸 다와치(達瓦齊, ?–1759)의 반란을 평정할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왼손으로 고삐를 잡고, 오른손에 긴 창을 움켜쥔 채, 두 다리로 말을 단단히 조이고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용맹한 자태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진법(陣法)과 신체 훈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병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체 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술 연습은 참여자들이 정해진 진법도(步陣圖)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자십삼종비서병형(喻子十三種秘書兵衡, 유자가 지은 열세 가지 비밀 병법서)』에 수록된 「칠성진(七星陣)」과 〈보병과 기병의 전술훈련 배치도〉를 소개하여, 군사 훈련이 병사의 신체 감각과 움직임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조명합니다.
방중술(房中術)과 춘화
방중술은 옛 사람들이 신체를 단련했던 또 다른 방식으로, 이는 남녀 간의 성행위에서 호흡과 감정의 조절, 다양한 언어와 신체적 움직임을 포함하는 요소들을 다룹니다. 명대 중국 문인들의 수필, 문집, 가훈에서는 방중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학 및 양생 관련 문헌에서도 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방중술의 주요 목적은 장수와 건강 유지, 질병 예방 및 치료였으며 더욱 중요한 의미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중국 서적에 성과 관련된 그림과 문헌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춘화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전후의 서양 사회에서는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한때 철저히 ‘은폐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볼 점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성생활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현재 남아 있는 방중술 관련 문헌들이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기록되었으며, 방중술이 남성의 이익을 고려한 기술로 여성은 남성의 수행 도구처럼 여겨졌고, 성관계에서 남녀가 동등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명대 문헌에서 성행위 시 남녀 관계의 조화, 침실 분위기의 조성, 개인적 욕망의 조절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수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역시 성생활에서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필경산방변이채(筆耕山房弁而釵, 필경산방의 관모와 비녀)』, 『수진연의(修真演義, 도교 수련 이야기)』 등 중국 고서에서 방중술과 관련된 묘사를 소개합니다. 또한, 서양의 춘화가 그려진 코담배 상자 뚜껑 또는 은폐된 내부 장식도 함께 전시하여, 양성의 성생활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양생과 수행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자손의 번영과 생명의 지속이라는 중요한 의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도인술(導引術)
-
『이문광독(夷門廣牘)‧적봉수(赤鳳髓)』 오금희(五禽戲)
(명 만력 연간, 금릉(金陵) 형산서림(荊山書林) 간행)
(명) 주리정(周履靖) 편찬
평도(平圖)012489-012490도인(導引)은 호흡과 신체의 몸을 늘이고 펴는 동작을 중심으로 한 양생법으로, 생각으로 동작을 이끌고 호흡과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도인술은 고대에서 기원하여 한대에는 이미 널리 유행하였으며, 도교계통과 의료계에게 중시되었습니다. 이후 도교에서 이를 계승하여 수련 방법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인술로는 오금희(五禽戲)와 팔단금(八段錦)이 있습니다. 오금희는 호랑이, 곰, 사슴, 원숭이, 새의 동작을 모방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기법입니다. 『장자(莊子)』에 등장하는 ‘곰처럼 웅크리고, 새처럼 뻗는다’ 개념과 마왕퇴(馬王堆)의 한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도인도(導引圖)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후한의 명의 화타(華佗, 약 145-208)가 이를 체계화하여 전수하면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오금희가 도해와 문장이 함께 수록된 형태로 전파된 것은 명대 이후로, 대표적으로 주리정(周履靖, 1549-1640)의 『적봉수(赤鳳髓)』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단금은 본래 여덟 조각의 화려한 비단 천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후대에 여덟 개의 동작으로 구성된 도인술의 명칭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북송의 홍매(洪邁, 1123-1202)가 저술한 『이견지(夷堅志)』에서 이미 그 명칭이 언급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동작 설명과 도해가 포함된 기록은 16세기 이후의 『적봉수』 등 양생 도서에서 확인됩니다. 내용에는 동작 설명, 구결(口訣), 그리고 도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