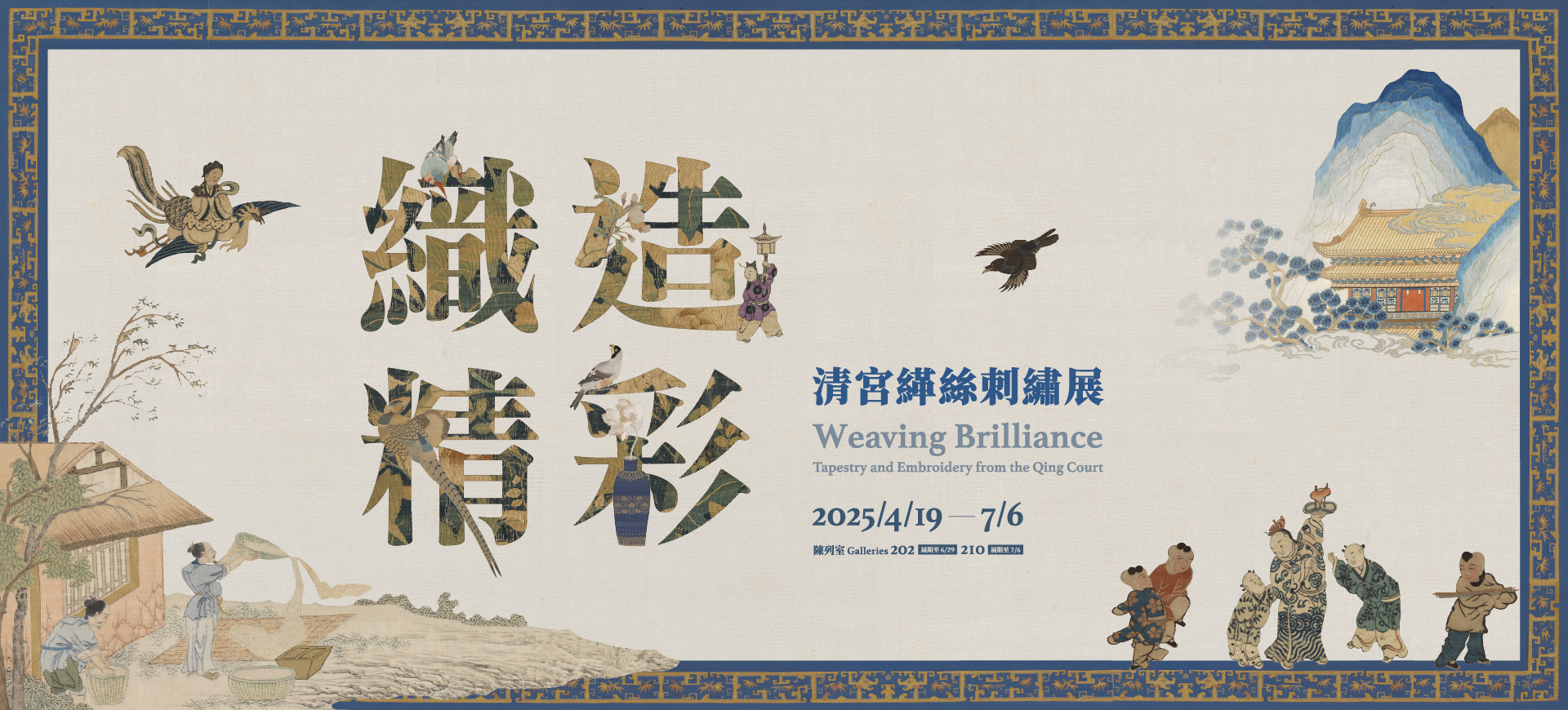황제의 서화와 시문을 짜 넣은 직물 작품
-
청 격사로 짠 황제의 친필이 있는 새로운 해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故絲000093
건륭 23년(1758년), 고종은 북송 동상(董祥)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수묵화 〈새해 아침 그림〉을 감상하였습니다. 그는 이 그림에서 동백꽃, 매화 가지, 솔잎, 영지, 감, 백합 등으로 구성된 깨끗한 제물인 청공(淸供)을 보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추운 계절에도 늘 푸르다는 상서로운 의미를 느꼈으며 이를 길조로 여겼습니다. 이후 수년간 군신 간에 이 작품을 바탕으로 여러 점의 모사작과 청 궁정에서 격사로 만든 복제본이 제작되었으며 이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격사 작품은 선을 따라 자수를 놓아 윤곽선을 표현하는 기법과, 실을 겹쳐 입체감을 더하는 기법으로 대상의 윤곽을 표현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촘촘히 실을 메워 색면을 형성하는 기법으로 색을 채웠습니다. 꽃잎의 색의 번짐을 표현하기 위해 빗살처럼 실을 겹쳐 수놓는 기법을, 그리고 명암과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길고 짧은 실을 교차시키는 기법으로 영지의 색조 층위를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꽃병의 파초문과 연꽃문은 금사를 사용해 짠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화면은 맑고 우아하며 화려합니다. 격사에는 ‘신소여의어필(新韶如意御筆)’이라는 묵서와 함께 ‘건륭’, ‘청공이목모(清供耳目謀)’, ‘선이순풍(扇以淳風)’, ‘신조발춘연(新藻發春妍)’ 등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
청 격사로 짠 황제의 양심전(養心殿) 명문 족자
故絲000108
청 고종(1711–1799)은 성씨가 애신각라(愛新覺羅)이고 이름은 홍력(弘曆)입니다. 연호는 건륭(乾隆, 1736–1795)이며, 60년간 재위하였습니다. 문장을 매우 좋아하고 소장품도 풍부했으며, 국정을 돌보는 틈틈이 붓글씨와 그림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이 격사 작품은 건륭 15년(1750년)에 청 고종이 해서로 쓴 양심전(養心殿) 명문을 바탕으로 짜여졌습니다. 청궁의 『조판처활계당(造辦處活計檔)』 기록에 따르면, 건륭 40년(1775년)에 고종이 소주직조(蘇州織造)에 명하여 양심전 명문을 확대하여 그대로 격사로 제작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건륭 시기 황제가 쓴 시문을 중심으로 한 직물 제작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청 격사로 짠 황제 찬문과 석가모니불 족자
故絲000123
건륭 시기는 격사 서화의 전성기로, 특히 대형 불화 작품이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석가모니불이 영락 장식이 드리워진 보배로운 깃발 아래에서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하늘에서는 꽃 비가 내리고, 화면 상단에는 푸른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청 고종이 건륭 27년(1762)에 쓴 찬문이 행해서체로 짜여 있습니다. 화면의 도안과 어제 찬문은 모두 청 궁정 소장본 〈명대 정중(鄭重)이 그린 석가모니상〉 족자에서 유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작품은 사용된 실이 가늘고 고르게 짜여 있으며, 채색이 화려하고, 자수를 마친 뒤에는 붓으로 색을 덧입혔습니다. 그림 속 세부 표현과 명암의 대비는 모두 그리는 것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청대 격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석가모니의 얼굴과 몸통의 살빛에 표현된 붉은 기운, 하단 연꽃 잎 끝부분 등은 모두 자수를 마친 후 붓으로 물들인 것으로, 오색 구름 부분에 빗살무늬로 겹겹이 짜 넣은 질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
청 격사로 짠 큰 ‘수(壽)’자 글씨 족자
故絲000100
이 족자의 제목이 적힌 표식에는 ‘황태후께서 ‘장춘익수(長春益壽, 오래도록 봄처럼 생기가 넘치고 장수를 기원한다)’라는 글귀를 직접 쓴 한 폭’이라 적혀 있으며, 이는 자희태후(1835–1908)가 쓴 ‘수(壽)’ 자를 원형으로 삼아 제작한 대형 격사 자수입니다. 붉은색의 큰 ‘수’ 자를 중심으로 목란, 모란, 해당화, 난초, 복숭아꽃, 장미, 등나무, 수국, 수선화, 영지, 매화 등 사계절의 꽃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습니다. 화면 전체는 고르고 촘촘하게 짜였으며, 꽃과 잎사귀의 자수가 완성된 후에는 붓으로 색을 덧입히고 세부 윤곽을 그려 정밀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형식은 청 초기 이후 유행한 소주판화와 유사하며, ‘복(福)’, ‘수’ 등 서예의 글씨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공간에 꽃 문양과 신선 등 길상적인 뜻으로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주판화의 특징과 비교할 때, 이 작품은 색채가 담백하면서도 화려하고 웅장하여 황실의 기품이 느껴집니다.